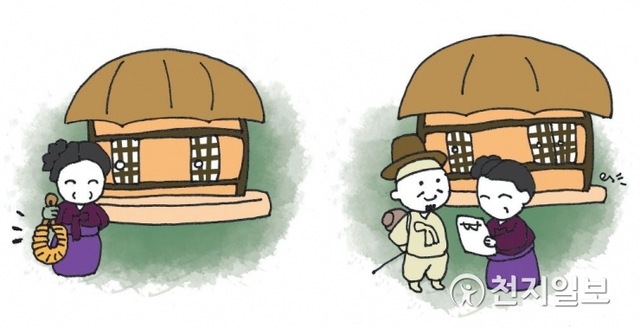
영수증 있으면 전국 이용 가능
마지막 주막서 남은 돈 정산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여름이다. 날씨가 무더울수록 조금은 여유를 부리는 시간을 갖고 싶다. 이럴 때 생각나는 것은 ‘여름 여행’이다. 그런데 여행을 하고자 하면 늘 돈이 필요하다. 요즘은 카드 한 장이면 국내외어디든 떠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어떤 돈을 사용했고, 어떻게 돈을 들고 여행을 다녔을까.
◆세상의 소문 가장 빠른 곳
과거 우리나라는 화폐수단으로 ‘엽전’을 사용했다. 놋쇠로 만든 옛날의 주화로 대체로 둥글고 납작하며 가운데 네모진 구멍이 있었다. 최초의 엽전은 중국 진나라 때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996년 성종 때 최초로 건원통보를 주조했다. 이후 상평통보, 팔방통보, 대동전 등이 만들어졌다.
구멍에 줄을 달아 허리 주머니에 차고 다니면 엽전끼리 부딪혀 ‘찰랑찰랑’ 소리도 났다. 놋쇠로 만들다보니 여행을 다닐 때 무게감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여행 다닐 때 어려움도 있었다. 이럴 때 여행자의 여행경비를 맡아 주던 곳이 있었으니 바로 ‘주막’이다.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곳은 밥이나 술을 먹고, 잠을 자는 곳으로만 나오지만 주막은 그 이상의 역할을 했었다. 주막은 사람들이 만나는 교통로 부근에 위치했고, 많은 정보가 오가는 공공장소였다. 시장 어귀마다 목을 축이기 위해 주막이 있었고 이곳은 이런 저런 귀동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세상 소문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다 보니 암행어사가 신분을 속이고 주막에 들어가 민심을 살폈다. 또 각종 정부 시책을 홍보하는 장소였다. 정조는 주막에 조정 홍보 벽보를 붙이는 일을 소홀히 한 군수는 물론 지방 관원들에게 죄를 묻기도 했다.
◆전국 네트워크망 가진 주막
은행의 역할도 빠지지 않았다. 여행자는 처음 엽전 꾸러미를 맡긴 A주막에서 금액을 적은 영수증을 받았다. 이후 B주막에서 영수증을 보여준 후 먹은 음식과 술, 숙박비 내역 등을 그 영수증에게 기입했다. 이후 들른 다른 주막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른 주막에서 정산 후 남은 돈을 돌려받았다. 이렇게 하면 무거운 엽전을 전부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편히 여행할 수 있었다.
1903년 조선을 방문한 폴란드 작가 바츠와프 시에로셰프스키는 ‘코레아, 1903년 가을’에서 주막에서 신용거래가 이뤄진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아놓았다.
조선에 들어온 시에로셰프스키는 주막에서 은행식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그는 주막의 영수증을 이용하지 않고 여행경비로 환전한 약 24.5킬로그램의 무거운 엽전 1만개를 매일 들고 다녔다. 하지만 그 편함을 보고 나중에는 이용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한다.
이처럼 주막이 은행과 같은 역할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 당시 화폐는 무게감이 있었고, 분실 위험도 있다 보니, 마치 여행자 수표와 비슷한 맥락에서 주막에서의 신용거래가 발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주막은 전국적인 은행 네트워크를 가진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다.

